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여성혐오주의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여성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재미없고 미학적이지 않으며 부적절하다”는 말로 여성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반대했다. 또 “올림픽에서 여성의 역할은 메달을 나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살다 간 인물의 구시대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21세기인 지금도 국제 운동 경기 대회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젊은 여성들을 볼 수 있다.
갑자기 시상식 도우미가 떠오른 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앞두고 있어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비교적 최근에 열리지 않았던가?’ 착각했던 이유는 한 글자만 다른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2010년에 열렸던 탓이었다. 기억에 의하면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시상식 도우미에 관한 논란이 꽤 시끄러웠던 대회이기도 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도우미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무려 60만 명이나 몰렸다. 그 가운데 나이 17~ 25세, 키 168~178cm인 여성 380명을 선발했다. 보수도 없는 자원봉사였고 혜택은 숙식을 제공받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도 선발된 여성들은 도우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40일이나 훈련받았다고 한다.
또 이들이 입은 유니폼은 몸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중국의 전통의상 치파오를 변형한 드레스였다. 일반적인 치파오보다 얇고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으면 속옷라인이 그대로 드러나서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서 ‘시상식 도우미’라고 검색하면 치파오를 입은 광저우 도우미들의 이미지가 홍수를 이룬다. ‘시상식 도중에 쓰러진 광저우 도우미’. ‘도우미의 뒤태를 뚫어져라 보는 모 야구 선수’ 등의 기사를 보면 당시 광저우 도우미를 향한 대중의 저열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다.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다가도 그 옆에서 쟁반이나 꽃다발 따위를 들고 선 젊은 여성들을 보면 이내 흥이 깨질 것 같다. 시상식을 도울 컴패니언(도우미는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 당시 ‘컴패니언’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공모전을 열었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을 채택, 그때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이 필요하다면 왜 하필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어야만 하는가? 국제 대회를 경험하고 싶은 이라면 여성, 남성, 청소년, 노인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가?
다행히 2012년에 열린 런던올림픽에서는 구시대적인 성차별에서 한 발짝 나아간 광경이 연출됐다. 시상식의 진행을 돕는 남성 도우미를 최초로 선보였다. 런던올림픽의 기치가 ‘양성평등’인 덕분이었는데 이는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내건 공약이기도 했다. 또 그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돌아보면 대회 도우미는 어린 시절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존재였다.
‘시상식 도우미는 왜 여자만 하는가?’
질문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권투 경기에 왜 라운드 걸이 필요한가? 명절에는 왜 여자들만 부엌에서 일하는가? 혼자서는 답을 구할 수 없어서 어른들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다.
“원래 그런 거야.”
그때 이후로 ‘원래 그런 거야’는 ‘내가 싫어하는 말 빅3’ 내에 등극했다. 이 말은 애초에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게 옳다고 우기고 싶을 때 등장하는, 생각하기를 포기한 자의 게으른 말이다. 당연히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는 상당한 폐단이 숨어 있다. 우리의 문명도 ‘원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한 사람들 의해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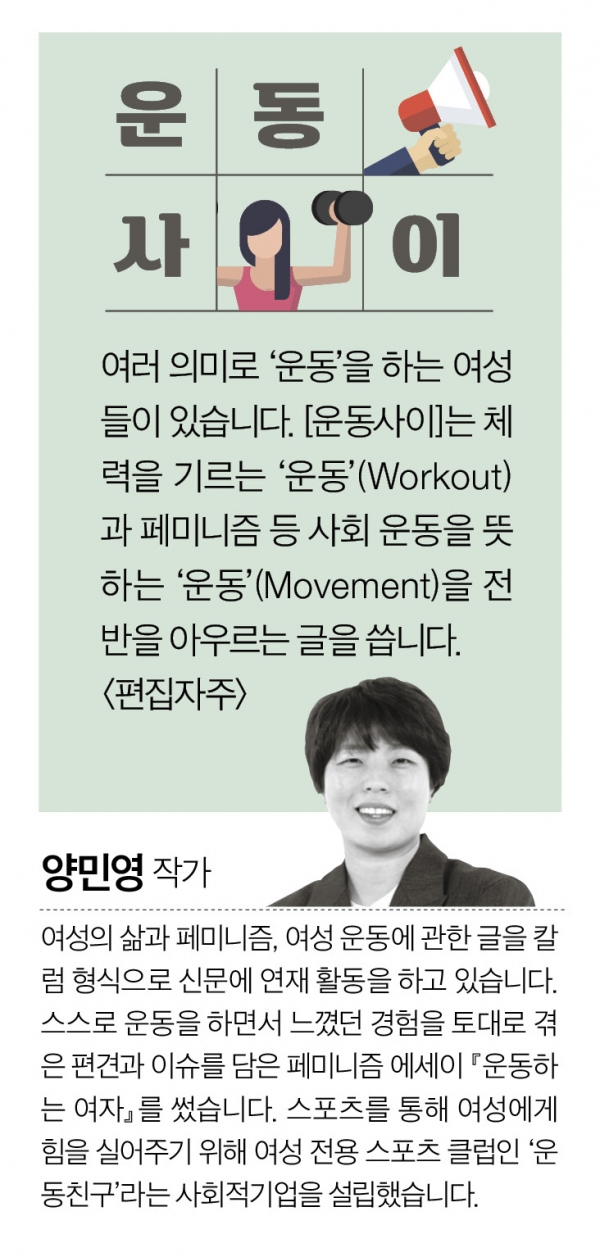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