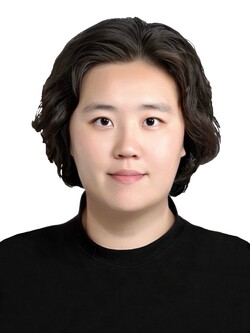“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민이라는 증빙을 더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승계농이 되면서 농업경영체 인정을 받기 위해 부친 소유의 일부 농지를 증여받는 과정이었다. 자경농민의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영농활동을 이어갈 경우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영농자녀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보통은 농지원부나 농자재 구매내역서 정도로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그 이외의 것을 더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조합원 인증서라거나 이장의 영농사실 확인서라거나. 그 말인즉 내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소리다.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며 트랙터, SS기 몰고 고치고, 지게차와 트럭 운전했는데. 온전히 내 힘으로 과수원을 운영해 왔는데. 고작 인적사항의 성별과 나이를 보고 국가의 공적 기관이 내 영농활동에 규정 외의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내가 남성이었다면 이런 의심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내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거주자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내내 미묘한, 혹은 대담한 성차별을 수시로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은 일상에서도 매번 차별의 벽을 마주친다. 유리천장이 아니라 너무 잘 보이는 탄탄한 벽이 둘러싸고 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존재 여부를 무조건 확인받게 된다.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면 “사장님 안 계세요?”라는 질문을 듣는다. “제가 사장인데요.”라고 답하면 “아니, 남자분 안 계시냐고요.”라는 대답을 듣는다. 남자가 아니면 못 믿는다며 계약서 작성하길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젊은 처자가 무슨 사연으로 혼자 이 큰 농사를 짓느냐, 여자 혼자선 농사를 못 지으니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한다 등 요즘 세상에 가족들도 잘 꺼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시골에서는 아직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웃으면서 능글맞게 잘 넘기지만 이럴 때마다 피곤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상적 성차별은 많은 부분이 제도적 차별로부터 기인한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보장 누락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여성농민들의 삶을 불안정한 종속관계에 머무르게 만들어 왔다.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중 여성 비율은 50.7%로 절반을 웃돌며 농작업을 분담하거나 도맡아 하지만 전체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대상인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이 10% 정도로 매우 낮다. 자신 소유의 농지가 없거나 본인 명의의 판매실적,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계를 위해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 역, 즉 아내가 경영주이고 남편이 공동경영주인 사례는 성립하지 않는다. 심지어 여성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고 남성이 보조하는 경우에도 경영주는 보통 남성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다.
이렇게 경영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들은 농업에 평생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농업인에게 보장하는 농민수당, 연금이나 보험, 세제 등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거나 부족하다. 심한 경우는 완전히 무직자 취급을 받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경영체등록 제도는 개별 농업인이 기준이 아닌 농업 필지에 속한 가구당 한 명의 경영주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동경영주, 혹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집계한다. 예전엔 공동경영주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니 나아졌다고 하지만 공동경영주 역시 경영주에 속한 부수적인 인력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경영주 외 인력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여성농민들은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지위 보장을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없음은 자명하다 성토하고 있다. 제도가 변하면 일상의 인식이 변한다. 농업계의 각 기관이 여성농업인들의 존재와 공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히 대우한다면 일상적 성차별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언젠가 농촌지역의 성차별이 해소되는 날이 온다면 그 날은 이 땅의 성차별이 사라지는 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