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석, 글쓰는 여자의 탄생》(장영은 엮음, 민음사, 2018)
2018년 여성의 날에 나왔던 책을 다시 읽는다. 부제와 카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페미니즘 구호들이 새삼스럽게 반갑다.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꾸준히 출간되는데 이전만큼의 지지를 체감하기 어렵다. 2010년대 페미니즘 리부트를 경험한 이래 조금 익숙해졌는지도, 혹은 백래시에 조금 움츠러든 걸지도 모르겠다고 반성해보았다.
왜 다시 나혜석일까. 이 글을 쓰기 전에 오래 자문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일본에서 공부한 엘리트 여성이 불륜으로 이혼하고 파국에 이른 삶은 그간 대단한 스캔들이자 시빗거리였으나, 어쨌든 그녀는 비교적 다른 초기 여성 작가에 비해 잘 알려진 편이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관에서부터 정치와 삶의 관점으로 이어지는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며 새롭게 발견하는 나혜석 생애의 현대적 의미와 엮은이 장영은의 작업에서서 묻어나는 고민을 다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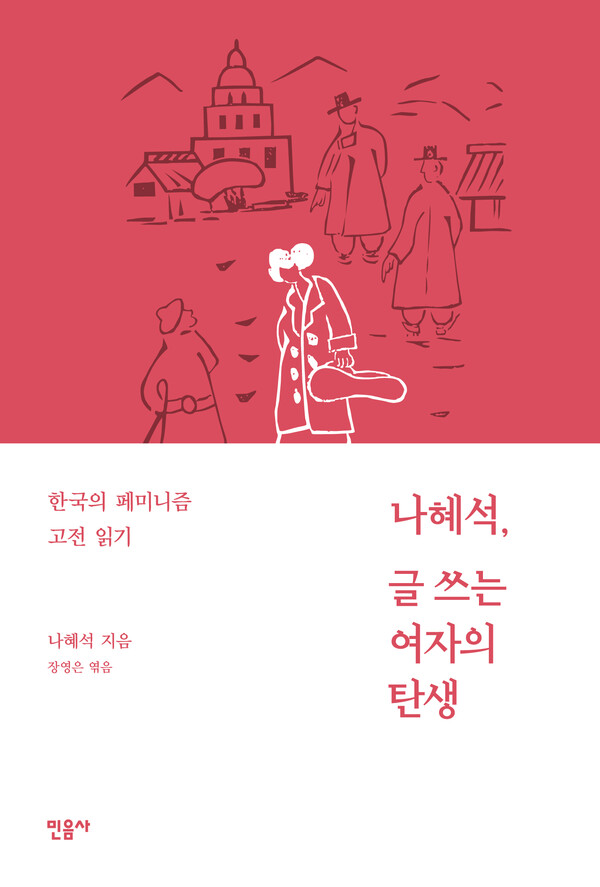
솔직히 말하자면 《나혜석, 글쓰는 여자의 탄생》은 지난 며칠간 극심한 악몽을 전해주었는데, 이 책을 처음 읽던 7년 전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막 마치고 돌아온 소녀의 강한 에너지가 담긴 〈경희〉를 인상에 담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이혼 고백서〉를 곱씹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 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 이 어이한 미개명의 부도덕이냐.” (200)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금실 좋게 지냈으나 끝내 그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로 인해 간통의 혐의를 받은 여자는 이렇게 분을 낸다. 이 글을 발표하면서 나혜석은 예술계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외면받게 된다. 과거의 여성들은 이렇게 불쌍했다,로 읽고 지나갈 수 있는가. 한국 여성에게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는 어떠한가.
나는 여기까지 쓰고 오래된 파일함을 뒤졌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없지만 6년 전 전남편의 외도가 상대방 남편에게 발각되어 내게 모든 사실이 통보되었을 때, 나는 얼굴도 모르는 상대 여성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이 모든 대면 논의가 남편이라고 위치 지어진 남성들을 통해 사유 재산을 가르듯 이루어지는 일 또한 무척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혜석의 시대로부터 나는 자유로운가 되묻는다. 홀로 유학길에 올라 이런 우세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나혜석의 가족이던가, 나의 혈육이던가. 여성으로 사랑을 얻고 잃는 일 주변에는 왜 차별과 편견이 여전한가.
이 책을 엮은 연구자 장영은은 서문에서 “조선의 현실이 여성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나혜석은 왜 〈이혼 고백장〉을 발표했을까?”(8) 하고 질문한다. 이 통탄할 현실을 밝혀내고 기록하면서 언젠가 순환하는 역사 속에 되찾을 여성의 지위를, 나혜석은 꿈꾸고 썼다. 그녀의 글은 분명 미래 독자를 향해 있었다. 2025년의 우리는 그 안에서 과거 여성 지식인의 험난한 운명을 보고, 오늘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난제들을 다시 확인한다. 문학평론가 박혜진은 “무엇보다 100년 뒤에 그의 글을 읽는 장영은 선생의 글이 있어 현장감과 현재성이 강화되었다. (...) 후대의 사랑과 노력이 과거의 작품을 고전으로 만든다”라고 적었다.
나는 지독한 꿈에서 깨어나 단정한 옷을 걸쳐 입고 제때 출근했다. 적어도 더 이상 방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준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대해 쓰고, 좀 더 나아진 내일을 향해 오늘도 치열하게 글을 써나가는 사람들의 책을 만들며, 미래의 독자와 고전의 희망을 생각하고 싶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