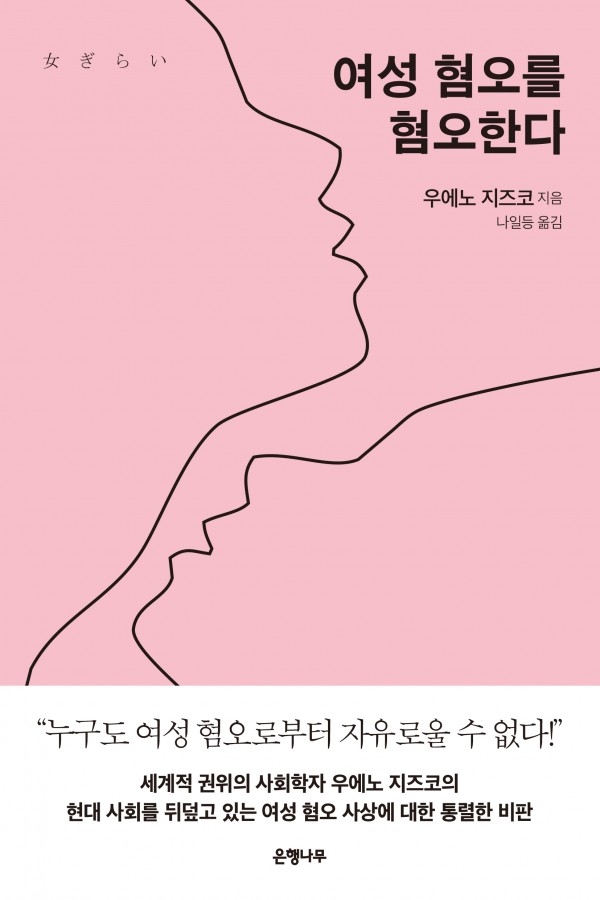
2010년대 중반 ‘여성혐오’라는 번역어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특히 여성학자 정희진 씨의 문제 제기가 주목할 만한데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에노 지즈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가 번역 출판되면서 ‘여성혐오’라는 말이 대중에 퍼졌다. 그러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제목은 원제와 다르며, 일본에서는 ‘미소지니(misogyny)’라는 단어가 가진 맥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어를 외래어로 표기해 사용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혐오’라는 번역어 탓에 미소지니의 본뜻이 왜곡되어 버렸고 그 결과 ‘여성혐오 대 남성혐오’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발단을 제공했다.
중요한 지적이었으나 논쟁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로 식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관심과 이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역시 논쟁이 필수불가결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논쟁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어의 ‘여성혐오’가 미소지니의 맥락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로 고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혐오’라는 번역어의 역사는 오래됐다.
미소지니는 1970년대 문학비평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성혐오’라는 번역어의 초출(初出)은 나도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국 문헌에 ‘여성혐오’가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2000년대부터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문헌에서부터 ‘여성혐오’라는 한자어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미소지니를 번역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외래어 표기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외래어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단어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여성혐오'라는 한자어로 설명을 더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에서도 용어 설명부터 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완벽한 용어법은 대체로 불가능하다.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용어법에 관한 지적이다. 미소지니는 여성 배제의 기제 전반을 가리키는 데 반해, 한국어의 ‘여성혐오’는 문자 그대로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꺼린다’는 일차적 의미(편의상 사전적 의미의 용어법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로 통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텐데, 우에노의 책은 내용을 그대로 두고 ‘여성 숭배’라는 제목을 붙여도 좋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어와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feminism)’이 그렇다. 19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 단어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녔다. 19세기 말 여성참정권운동 시기에는 금주(禁酒) 운동과 노예제 철폐와 관련이 있었다. 1960년대 여성해방운동 시기에는 섹슈얼리티나 생식권(生殖權)과 관련이 있었다. 젠더 이분법에 대한 대항이나 가부장제 질서의 해체라는 의미를 띠기 시작한 것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문적으로도 성숙해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다. 사실 사회학에서는 단어만 들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말이 많다. 게다가 함의가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용어만 먼저 대중화되어 엉뚱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흔하다. 실례로 많은 사람이 페미니즘(혹은 ‘여성주의’라는 번역어)이라는 단어만 듣고 ‘여성우월주의’와 같은 것을 떠올리지 않는가. 보다 나은 용어를 찾는 일은 사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완벽한 용어법은 학자의 로망에 가깝다. 단어만으로 개념이 전달될 수 있다면 학문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문이 필요한 것이고 공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셋째, 용어법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사회 현상을 단순하게 바라볼 위험이 있다.
또 하나의 주요 논점은 ‘여성혐오’라는 번역어가 ‘여성혐오 대 남성혐오’라는 대립 구도의 발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지적은 용어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 현상의 원인을 잘못된 용어법으로 돌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나는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혐오’라는 용어 탓에 ‘여혐 대 남혐’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대립 구도에 용어를 덧씌운 것이 아닐까. 책이 나오기 전부터 여성 멸시적 언어가 주기적으로 유행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바란다. 2005년 ‘개똥녀’, 2006년 ‘된장녀’, 그리고 2010년경 ‘김치녀’. ‘여성혐오’라는 용어가 대중의 시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멸시적 언어가 유통되고 있었고 그것을 총괄하는 개념이 요구되고 있었다. 남성 권익 증진의 기치를 올리며 ‘남성연대’가 설립된 것이 2008년. 만약 ‘여성혐오’의 어감이 강한 탓에 남성들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 옳다면 ‘남성연대’의 설립 시기를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실제로는 ‘여성혐오’라는 용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백래시(backlash·반격) 현상이 관찰된 것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 페미니즘의 기운이 오르면서 그에 대한 반동도 더불어 선명하게 드러났고, 반동의 언어로 ‘남성혐오’가 선택됐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용어법에 대한 지적에 골몰하다 보면 사회 문제의 근원이 잘못된 용어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흑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부른다고 해서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흑인’을 대체할 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찾는 데에만 골몰하면 진짜로 중요한 일, 지금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성혐오’의 대체어를 찾는 일은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