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보면 끝이 있겠지요 - ‘29년생 김두리’ 구술생애사] 8화. 없는 살림에 공출까지
김두리 여사는 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할머니처럼 이름 없이 살아온 모든 여성들의 삶에 역사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역사 연표에 한 줄로 기록된 사건들이 한 여성의 인생에 어떤 ‘현실’로 존재했는지, 그 잔인하고 선명한 리얼리티를 당사자의 육성으로 생생히 전합니다. - 작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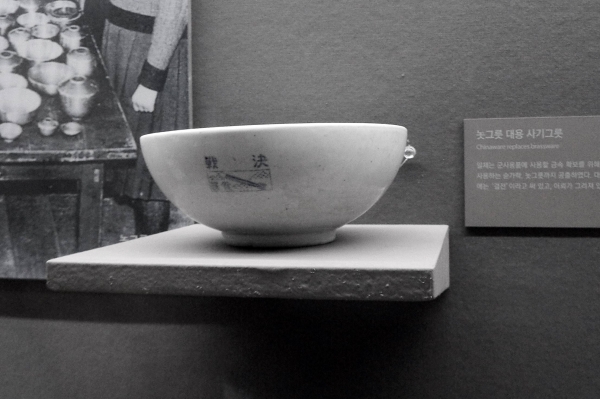
시집을 와서 보니까, 재산이 너무너무 없어. 아무것도 물(먹을) 게 없는 거야. 집 뒤에 가보니까 단지는 이만큼 크다꿈한(큼지막한) 게 있는데, 마카(전부) 뛰드려보이(두드려보니) 빈 단지야.
뛰드려보는 것도 사람 있을 때는 못 뛰드려봤어. 느그 할매[본인]가 시건(철)은 있었는 택(셈)이지. 두 모자[시어머니와 남편]가 장보러 간다고 자아(장에) 가뿌고 없고, 시아버지는 저쭈(저쪽) 사랑채에 있으니까, 안 듣기는(들리는) 거야. 크다꿈한 단지를 뛰드려보이 마카 빈 단지야. 탕탕탕. ‘이 집에는 뭐를 묵고 사노?’ 싶으더라꼬.
요만한 단지가 하나 있는데, 고는(거기는) 뚜드리이께 빈 단지 소리가 나긴 나. 근데 또 빈 단지가 아인 거 같더라고. 뚜껑을 디께(열어)보니까 고게 쌀이, 요새 말하면은 이십 키로 한 포대기(포대)도 될동 말동 담기 있더라꼬. 고기(그게) 양식이 다야. 요새같이 쉽게 팔아물[쌀을 사먹을] 수도 없었는데. 일제시대 그때는 돈을 쥐도(쥐어도) 어디 가(가서) 잘 팔아묵지도 모했다니까.
어더븐데(어두운데) 밤에 팔아서 오다가 만약에 면서기들인데(한테) 다들렸다(들켰다) 하면, 그양 뺏기고 실컷 당코(당하고, 혼이 나고)……. 쌀을 냈는[판] 집에도 당코, 팔어오는[산] 사람도 당는 거야. 곡석(곡식)은 그양 뺏기고. 돈도 앤 쳐주고 그양 자기네가 가주가 뿌는(가져가 버리는) 거야. 모르게 야매로(암암리에) 내(팔아)묵는다꼬.
[작가 :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나빴지. 와 “왜놈 앞잽이, 왜놈 앞잽이” 안 글나(그러나)? 면서기가 일본 사람이 맻이 있으면 한국 사람도 맻이 있거든? 그때는 한국이 아이고 조선이라 했지. 조선 사람도 맻이 있는 거야.
촌 내용을 촌 사람이 더 잘 아잖아. 말하자면 집 안에 사람캉(이랑) 집 밲에 사람캉 택(같은 셈) 아이가. 그 사람들[일본 사람들]으는 속속들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 맻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 하나둘 따라온다. 그 사람들[조선 사람들]이 더 앞서가지고 다 초디배는(뒤지는) 거야. 숨가놨는(숨겨놓은) 거 다 꺼내고.
즈그 수량대로 공츨 안 대고 묵고살 끼라꼬 숨가놨다가, 다들래서(들켜서) 나오면 또 뛰드려맞는다. 디배서 나왔는 거는 자기네 공출 수량 모잘래면 그걸 가주간다니까. 그래서 더 물 게 없었다. 농사지은 거 그양 묵고살라꼬 했으면은 그렇게 고상(고생)은 안 했지. 그래 배로 곯고, 물 게 없어서 산에 가서 꿀밤 따묵고…….

그래 시집왔는데 너무 물 게 없는 거야. 집도 하나 없지, 하다못해 조선솥[무쇠솥]도 한 쟁기 없더라꼬. 왜솥[알루미늄 솥] 하나 크다는 거 걸어놓고 그래 사더라꼬.
시집와가지고 두 핸가 지나고 또 느그 증조부[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새 생각하면 위암이야. 술을 마이 잡숫고, 위병이라 하더라꼬. 술병이다, 술병이다, 이라더라고. 느그 할아버지[남편]캉 나캉 결혼할 때, [편찮으신 지] 하머(벌써) 사오 년 됐는갑더라꼬. 그때 요새같이 약을 아나? 마 돌아가셨지.
시어른이 돈은 벌지는 모하고, 내가 시집와가지고 두 해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재산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논도 다 팔아묵고. 지금 덕정[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드가면 파계못 있고 동네 하나 있제? 그 동네 앞에 논 닷 되지기, 삼논 고런 기 하나 있더라고. 닷 되지기라면 한 마지기가 안 되고 반지(절반)야. 닷 되지기.
고걸 남 줘가지고 삼베를 해서 옷을 해입고 했는데, 그것도 공출로 돼뿌니까 땅주인 줄 거는 없는 거야. 자기네[소작인]는 좀 남으면 모르게 감직어(감춰)놨다가 옷을 하는지 우야는지, 우리는 그것도 몬 받고.
논이나 밭이나 나무(남의) 꺼를 얻어서 부치묵고 사는 거야. 나무(남의) 땅도 잘 없어. 시제(각자) 지을 것도 없는데 남 줄 땅이 마이 있나? 없어. 그때는 나무(남의) 꺼 두 마지기를 얻어 부쳐서 농사를 지으면, 한 마지기는 주인 주고 한 마지기는 우리가 묵고 그래 해야 됐어. 반지(반으로) 갈라묵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농사를 올케(제대로) 모하니까 흉년이 져서 더 물 게 없어. 요새같이 나락을 생산을 마이 내면 그렇게 고상을 안 할 낀데, 생산을 못 내니까 고생을 더 마이 한 기라. 물 게 없어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