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번역자가 본
책 제목 둘러싼 한국 출판계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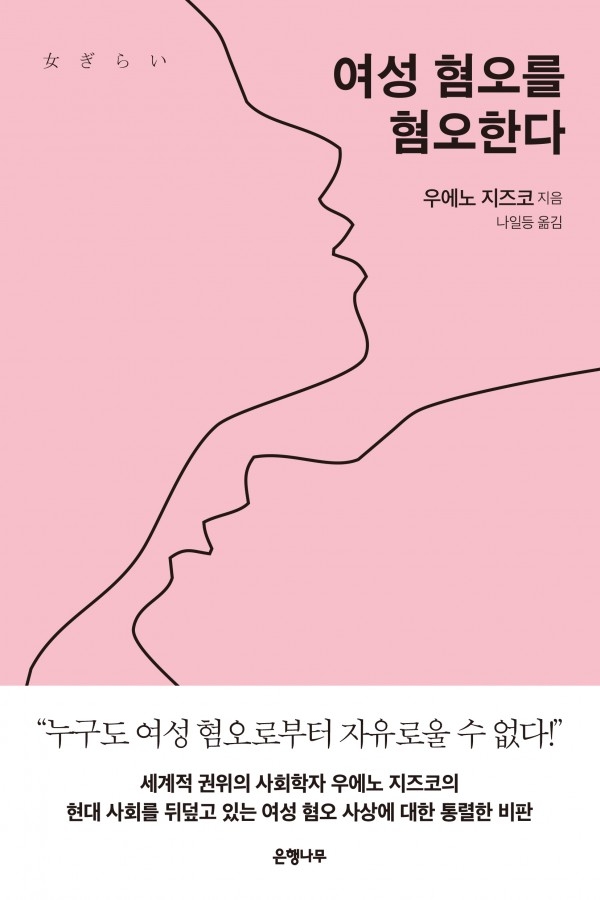
2012년에 우에노 지즈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를 번역 출판한 후 많은 반향이 있었다. 학계와 여성계 지인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물론 주된 피드백은 책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책 제목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았다. 책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다 읽고 난 후 고개가 더 갸우뚱해지더라는 것이다. 왜 이 책에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제목이 붙은 걸까?
이 책은 기노쿠니야서점출판부의 홍보지 ‘scripta’에 연재된 글을 모은 것으로, ‘scripta’는 출판사 홍보를 위해 무료로 나누어 주는 얇은 팸플릿이다. 그래서 필자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우에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풀다 보니 어느새 페미도(femi度)가 상당히 높은 글이 되어 버렸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책 내용도 일반 대중서라기보다는 학술서에 가까운 교양서쯤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브 세지윅(Eve Sedgwick)이 19세기 영국 문학 작품을 소재로 남성의 ‘호모소셜리티’를 분석한 이론을 일본 사회에 적용해 논하는 내용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만,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역시 우에노. 두루뭉술한 이론도 그의 손에 걸리면 현실 속 이야기로 구체화한다. 가히 우에노의 정수라 할 만한데, 상징적인 비유와 인상적인 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독자는 남성 사회가 여성을 배척하는 구조를 꿰뚫어 보는 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처음 질문이다. 이런 내용의 책에 왜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제목이 붙은 걸까? ‘혐오를 혐오’한다니… 혐오를 혐오로 되받아치겠다는 말인가? 우에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당연히 아니다. 우에노는 남성 호모소셜리티의 메커니즘을 구체적 사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 혐오를 저주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말인데, 대체 왜 이런 제목이 붙은 걸까?
답은 ‘나도 모릅니다’이다.

일본판 원제는 『여성 혐오』
사실 원고 작업 과정에서 사용한 제목은 ‘여성 혐오’였다. 원제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나는 원제에 손을 댈 이유를 특별히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식상한 면도 없지 않았는데, 우에노는 이 제목을 듣고 “원제랑 똑같잖아. 재미없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출판사였다. 나는 출간을 앞두고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래서 출판사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제목이 붙게 되었는지 모른다.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데, 나는 이 제목이 좋은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슬프게도 한국 출판사와 일을 하다 보면 저자(역자)의 동의 없이 원고나 제목이 수정되는 일을 종종 겪곤 한다. 당시 나는 이런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계약할 때는 원고의 오탈자조차도 역자 허락 없이는 고칠 수 없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출판사는 너그럽게도 그걸 받아주었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는 나의 확인을 거친 원고가 출판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런데 아차! 제목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다.
출판사 명예를 위해 미리 말해두지만, 이런 관행이 어떤 악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를 낸 출판사는 (출판된 책들을 보면 금방 알겠지만) 열린 마음과 프로 의식을 가지고 양질의 책을 많이 내는 곳이다. 역자의 확인 없이 책을 출판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주는 출판사는 아마도 매우 드물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 출판사의 관행이 아니라 한국 출판계 전체의 관행이다.
소비자 요구에는 회사 철학도 담겨
어쨌든, 제목을 통보받은 나는 절망했고 그래서 담당 편집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출판사의 관행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일본 출판계와 비교하면 설명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편집자와의 공동 작업’이 꿈이 아니다. 최종 인쇄본 수준의 교정쇄가 저자와 출판사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고, 교정 작업에만 몇 개월을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다만, 이것은 일본 출판계가 한국보다 더 성숙하다거나 종사자들의 프로 의식이 더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책의 제작 과정에 한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일본 출판 시장의 규모가 한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더 쉽게 말해, 일본 출판사들은 한국 출판사만큼 판매 부수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저자의 확인을 거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바람을 이야기하자면, 초조함을 버리는 것도 판매 부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소비자 기호에 맞춰 팔릴만한 상품을 예상해 내놓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소비자 요구 속에는 회사의 장기적 철학이라는 요소도 들어 있다. 눈을 끄는 제목은 소낙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충성스러운 독자를 획득하는 것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모로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 현재 출판 업계이지만 그럴수록 무게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