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아드리엔느 리치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다나 해러웨이
21세기 여성은 ‘사이보그’
선언한 다나 해러웨이
“사이보그는 모든 이들과
적대관계이며, 동지다”

최근 우울하게도 ‘살해되는 여성’에 이어 자식을 ‘살해하는 여성들’ 이야기가 포털에 오르내렸다. 두 아이를 죽이고 손목을 그었던 엄마들, 두 딸을 데리고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던 여성.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꼭 아이들을 죽여야만 했나?’ 들쑥날쑥 맴돌던 생각이다.
아드리엔느 리치가 쓴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1986)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자식을 죽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엄마가 아이의 목을 베어 죽여 버렸대. 그 엄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아?’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모성이 어떻게 여성들을 질식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한다.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식을 살해한 여성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공감과 비판을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파워풀하다. 여든이 넘은 노인들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글썽거린다. 누가 어머니를 모욕하겠는가?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강요되고 이상화된 모성의 화법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과감하게 말한다. ‘어머니는 없다’. 모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섞이지 않은 채 맴돌고 있다.
더 이상 ‘어머니’로 불리고 싶지 않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던 여성들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막다른 골목’(Cul De Sac, 쿨데삭)에 다다랐다. 그들은 모성을 거부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식살해’라는 광적 결단을 보여줬다. 결국 평생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둬버렸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는 수많은 여성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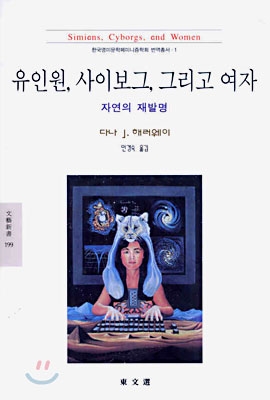
다나 해러웨이는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1991)의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지난 1970, 80년대를 페미니즘이 인식론적인 쿨데삭에 부딪혔다고 진단한다. 더는 여성들 안에 공통적 억압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페미니즘 안에서 성매매, 가족, 결혼제도, 리더십 등, 여성 이슈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은 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해러웨이는 여성이라는 범주는 백인이 아닌 모든 여성을 부정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논쟁들은 페미니즘이 논리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버린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해러웨이는 여성의 억압과 차별 사례들을 더 나열해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새판 짜기에 들어간다. 새로운 존재론을 제안해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21세기 여성을 ‘사이보그’라고 정의 내린다. 사이보그 정체성을 가진 여성에게 ‘일관적이고 체계화된 페미니스트 거대 담론’은 부적절하다.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이보그로 정의된 여성을 설득하지 못한다.
여성들은 착취당하는 노동자로, 차별받는 아시아인으로, 주변화된 어머니로의 정체성을 때론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이보그 정치학은 그 다양한 정체성들 사이를 오가는 변신의 기술이다. 일관성은 불가능하며 끊임없이 배신, 모순을 받아들이며 나아간다. 사이보그는 모든 이들과 적대관계이며, 모든 이들과 동지다. 사이보그 여성들은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에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들의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여기에 사이보그 정치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이를 죽여 버리고 수렁에 빠져버린 여성들에게 ‘사이보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심한 짓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에게 인식론, 존재론, 딜레마, 거대담론이라는 말처럼 의미 없는 말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고,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색한 사이보그 정치학을 말하려고 한다. 여성들은 여성이며 여성이 아니고, 노동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며,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아니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에 동의하지만, 때론 등을 돌리고, 노동운동에 참여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고발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거룩하며 동시에 세속적인 존재이고, 섹스는 쾌락이고 억압이며, 노동은 착취이고 기쁨으로 경험된다.
사이보그 정치학에서 정답은 없다. 단지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그 안에서 애매함을 횡단하며 유연함을 전략으로 삼는다. 사이보그 안에 그 다양한 정체성은 상반된 정치 입장을 취한다.
아이를 죽여서까지 책임지려 했던 그들의 모성이 안타깝다. 덜 사랑해도 될 텐데, 미워해도 될 텐데,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사랑해도 될 텐데. ‘나쁜 엄마’도 되고 ‘좋은 엄마’도 되는 그 변화무쌍한 변신술을 좀 더 발휘할 것이지. 그런 험난한 결단보다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며 살아남을 것이지. 변덕 부리는 괴물이면 어떤가? 21세기 우리 여성들은 사이보그라 하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