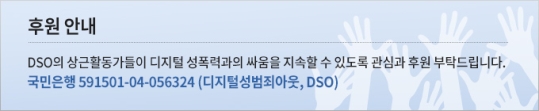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디지털 성폭력 아웃)'를 이끄는 하예나 대표(활동가)가 2월부터 여성신문 연재를 시작합니다.
하 대표는 2015년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활동가 연대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공론화를 주도했습니다. 2016년 경찰의 소라넷 폐쇄는 그가 계속해서 싸우고 더 강력하게 외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DSO 단체 설립에 나선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하 대표는 연재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무감각하게 벌어지는 성폭력 실태를 낱낱이 고발할 예정입니다. 코너명 ‘하예나의 로.그.아.웃’에는 디지털공간의 성폭력을 종료·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4~5년전 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특히 그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내에 가득했으나 일명 ‘쓰레기통’이던 소라넷이 사라지며 일파만파 퍼져나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보게 된다. 쓰레기통이 사라져 인터넷 문화가 엉망이 됐다며 소라넷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20년도 더 지난 1997년의 언론 보도기사를 소개한다.
“아마추어가 몰래카메라나 가정용 비디오카메라로 찍었다는 포르노 비디오가 지하유통시장에서 고액으로 팔리고 있다. ‘빨간 마후라’는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때문인지 지하시장에서 인기가 더 높아졌다. 여기에 탤런트 ㅇ아무개씨의 전화통화 내용 등 가정생활을 촬영했다는 비디오와 한 여대의 화장실을 몰래 찍었다는 비디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 의 첫날밤을 찍었다는 비디오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7년11월20일 제 183호>
여기에서 포르노라 불리는 ‘빨간 마후라’ 영상은 고등학생이 중학생 여학생을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유포형 성범죄” 와 동일하다. 여대의 화장실을 몰래찍었다는 비디오, 제주도로 신혼여행간 신혼부부의 첫날밤을 찍어 유포했다는 비디오. 이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가 아닌가? 그들은 본인들이 사랑했던 연인들을 단순 ‘음란물’로 만들어 판매했을 뿐이다. 그들의 인생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었을 뿐이었다. 또 1999년 신동아일보 박윤석 기자가 작성한 “세기말 포르노의 문화”라는 기고문은 더욱 경악스럽다. 이는 기고문은 꽤나 긴 글로 한국의 ‘포르노 문화(라고 부르고 범죄 문화라고 읽는다)’를 설명하고 있다. 한 남학생이 자신의 주변 여학생에게 ‘추억’으로서 영상을 보관한다며 영상을 찍은 뒤 판매하고자 했던 일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그려내며 그를 단순한 ‘음란물’ 양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어떤 언론은 청계천을 소개하며 그곳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이 비싼 값에 판매되는 게 흥미거리인듯 소개한다.
“외국물에 식상할 무렵인 88년부터 국내물이 본격 유통됐다.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회 범죄로 대두되자 '실제 성폭행' 장면을 담았다는 테이프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고가화 전략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80년대말 음란물 규제가 심해지면서 음란 테이프의 구입이 어려워지자 청계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사람의 하루 판매액은 대략 30만~50만원선. 추산하면 한달간 청계천 음란물의 매출액은 10억원가량 되는 셈이다. 복제품은 대개 경기도 벽제 등지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다. 국내물의 경우 제작경위나 장소 등은 극비. 얼마 전 세운상가 손님중 고장 난 비디오카메라 수리를 맡겼는데 그 안에 은밀한 장면이 담긴 테이프가 있어 곧바로 청계천 인기품목으로 등장한 것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에 쇼킹한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청계천은 활기를 띤다. 사회가 조용할 때는 일부러 소문을 만들기도 한다."
위의 기사 제목은 무엇일까. 청계천의 경악스러운 범죄 행각들? 아니다. 그저 ‘청계천 포르노그라피 변천사’일 뿐이다.
자료조사를 하며 이것을 목격한 당시 기분은 마치 사람을 구타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이는 문화입니다 하하하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과거 언론은 이렇게 범죄의 기록을 그대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범죄라고 칭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가 범죄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자들이나 독자들도 분명한 가해행위를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었다.
가정폭력과 비교하자면, 과거에 휘두르던 가정폭력은 교육이고 현재 가정폭력은 폭력이듯 포르노는 그저 포르노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성폭력이다. 조선시대의 당연한 관습이나 문화로 여겨져온 창호지 훔쳐보기가 명백한 관음이고 가해이듯 말이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일종의 유희로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 그런 환경 속에서 이를 ‘문화’로 인식하고 살아왔다. 이것은 일부의 문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였음을 기사들은 보여준다.
그런데 이것이 폭력으로 구분된 그 순간 그들은 이러한 범죄 행각들을 자신과 분리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면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알고 있다. “소라넷만 그랬어”라고 일부의 문제로 구분짓고 매도하며 본인은 일평생 그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방관자였고 가해자였으며 또 피해자였다. 이를 몰랐음을, 취향이 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임을 인지하고 바꿔나가야 한다.